안녕하세요. 서울인권영화제 상임활동가 소하입니다. 11월 2일에는 서울인권영화클럽 2회 정기모임이 있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 탓 이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오시진 못했지만 적은 인원으로도 알차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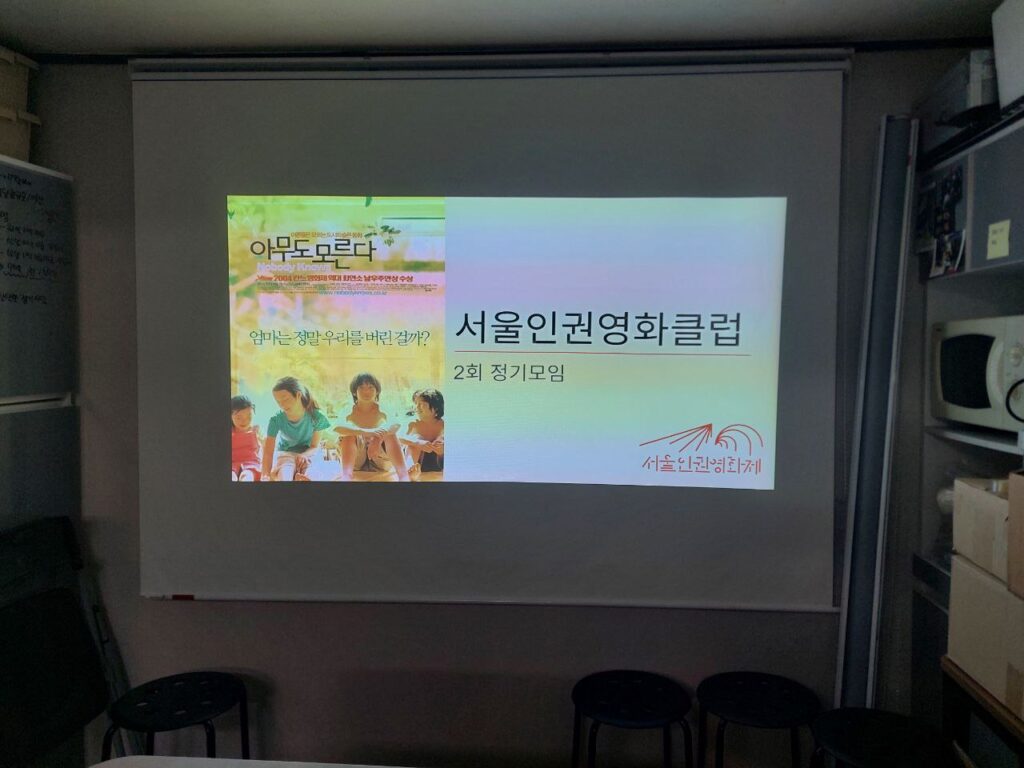
이번에 함께 본 영화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2004년도 장편영화 <아무도 모른다>였습니다. 한국에서도 유명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로 1988년 스가모 아동 방치 사건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간략한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영화는 12살의 첫째 아키라, 둘째 교코, 셋째 시게루, 그리고 막내인 유키가 크리스마스에 돌아오기로 약속한 엄마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일상을 보여줍니다. 아키라는 최선을 다해 동생들을 돌보지만, 엄마는 겨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당시 일본 사회의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무거운 영화였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모임원들은 돌봄, 아동 청소년 인권, 가족, 실화 기반 영화가 가져야 할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영화에서는 엄마의 빈자리로 생긴 돌봄의 공백을 4남매가 짊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남매는 뿔뿔이 떨어지지 않기위해서 어디에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자립의 길을 선택합니다. 당연히 엄마가 무책임하게 떠난 탓을 할 수도 있었지만, 우리는 좀 더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돌봄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했습니다. 돌봄노동은 대개 혈연가족, 특히 여성에게 전가되곤 합니다. 영화에서 아키라의 엄마가 집을 떠났듯 가족 내부에서 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 돌봄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가족구성원이 있을 경우 존엄한 일상은 불가능합니다. 부족하나마 몇몇 안전장치야 있겠지만, 돌봄을 사회의 공동책임으로 여기지 않는 이상필연적으로 생기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딱 떨어지는 정답이 없는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자립이 필요한 아동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인 ‘아동 청소년 인권’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아동 청소년이 온전히 자립할 수 있으려면 제도를 재정비하는 것은 물론 어린이・청소년이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의 아동 청소년 관련 법제도는 어린이・청소년을 ‘보호’의 대상, 또는 ‘통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2019년 선거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바뀌었듯, 어린이・청소년 역시 동료시민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를 누리고 사회적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합니다. 아키라와 동생들이 학교에 갈 수 없었던 것처럼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고, 노동을 하는 경우 노동자로서 정당한 권리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 있는 그룹홈이나 쉼터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온전한 자립의 형태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나눈 이야기는 ‘가족’이었습니다. 영화에서 어린이만으로 이뤄진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1인 가족, 동성 커플 가족,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은 여러 구성원으로 꾸려진 대안가족의 형태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가족을 새롭게 정의한다면 어떤 것일지, 우리가 원하는 가족의 형태는 어떤 것인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눈 이야기는 ‘실화 기반 영화가 가져야 할 윤리’에 대해서였습니다. 실화 기반 영화는 종종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도 합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을 미화하기도 다른 형태로 왜곡할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화 기반 영화는 어느 정도 윤리 기준과 가이드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다큐멘터리는 실제 인물의 현실을 편집해 보여주는 만큼 미디어 윤리에 대한 고민이 더 깊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사실을 무조건 있는 그대로 담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영화가 담고자 하는 바에 따라 사건은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너무 엄격한 팩트 체크는 오히려 검열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있었던 사건, 특히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을 영화화할 때 피해자를 대상화하거나 사건을 단순 소재로만 소비하는 것은 지양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세 시간이 훌쩍 지나 날은 어둑해지고 헤어질 시각이었습니다. 처음 <아무도 모른다>를 보았을 때는 어떤 인권 관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펼치다보니 세 시간이 아쉬울정도로 할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평소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서울인권영화클럽 3회 정기모임은 12월 6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bit.ly/shrfclub 으로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타인을 비방하거나 혐오가 담긴 글은 예고 없이 삭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