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국제금융기구(IMF)는 경제위기에 대한 ‘가혹한’ 처방의 대명사다. 자매 기관이라 할 수 있는 세계 은행도 그와 비슷한 이유에서 제3세계 국가들에게 악명이 높다.
세계 은행은 1944년 브레튼우즈 회의의 산물로서 전후 유럽 재건 과정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제3세계 개발을 촉진하는 기구로서 더 잘 알려져 있으며, 최근엔 주로 채무국에 구조조정 차관을 제공하는 데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세계 은행은 구조조정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차관을 제공하는데 여기서 ‘구조조정’이란 말은 일견 중립적인 듯 하지만 실은 신자유주의적 발전 계획을 채택하도록 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하지만 외채 부담에 시달리는 국가들은 자금에 접근하기 위해 선택의 여지없이 △무역장벽의 철폐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규제 해제 △공기업 민영화 △사회복지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축소 등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세계 은행의 정책가들은 이러한 구조조정이 경제 회생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선전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상반된 것이었다. 구조조정을 수용한 대부분의 중동과 아프리카 나라들은 경기 후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이들 국가들은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세계시장의 전장으로 내몰린 채 서구의 초국적 자본들에 시장을 잠식당했다. 생필품의 가격 상승과 사회복지비의 축소 등으로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됐다.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지에서 이렇듯 구조조정이 역효과를 드러내자 세계 은행과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문제점이 최근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비판이 거센 만큼 앞으로 세계은행과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개혁 가능성도 점쳐 볼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이 세계 은행의 정책 결정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은 개혁이 그리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이주영/인권운동사랑방 인권하루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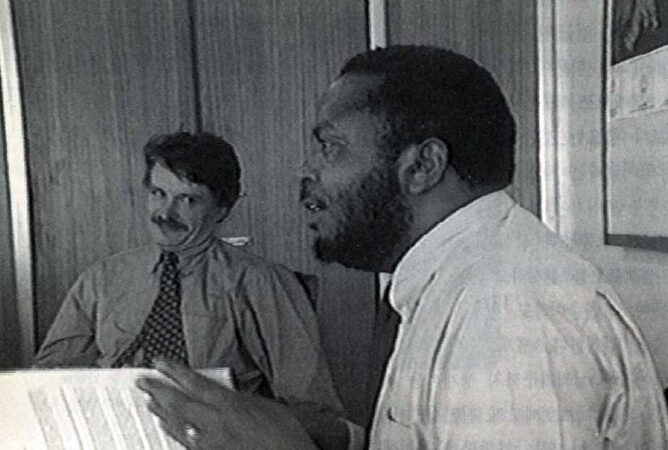
댓글
타인을 비방하거나 혐오가 담긴 글은 예고 없이 삭제합니다.